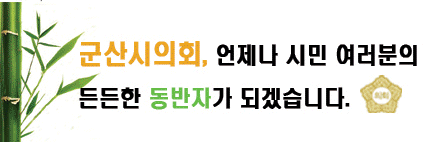2001년 미국 뉴욕에서 3000명을 사망케 한 9.11 테러가 발생했다. 어느덧 십 수 년이 흘러 붕괴됐던 세계무역센터 빌딩 자리에는 테러희생자 추모기념관과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인파가 다시 넘친다.
2001년 미국 뉴욕에서 3000명을 사망케 한 9.11 테러가 발생했다. 어느덧 십 수 년이 흘러 붕괴됐던 세계무역센터 빌딩 자리에는 테러희생자 추모기념관과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인파가 다시 넘친다.
만약 당시 테러집단이 추구하였던 데로 핵폭발장치나 핵물질 살포장치(더티 밤)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사망자가 10배 이상으로 늘었고 맨해튼은 최소한 수십 년간 사람이 살 수 없는 버려진 땅이 됐을 것이다. 파리, 뭄바이, 이스탄불, 런던, 브뤼셀 등 대량살상 테러가 발생했던 도시도 마찬가지다. 한국도 테러, 나아가 핵테러의 무풍지대는 아니다.
냉전기 동안 우리는 세계평화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핵전쟁’의 공포에 떨었다. 그런데 탈냉전기 들어 국가 간 핵전쟁의 위험성은 현저히 낮아졌지만 새로이 테러집단에 의한 ‘핵테러’가 인류의 최대 위협으로 등장했다.
저명한 그래함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2004년 발간한 책 ‘핵테러’에서 “향후 10년 내 핵테러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50%보다 크다”고 예언했다. 이후 그래함 교수는 한국을 핵테러 위험이 높은 나라로 꼽기도 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2007년 “핵테러는 현시대 가장 위험한 위협 중 하나”라고 경고하면서, 즉각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09년 4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한 프라하 연설에서 핵테러 방지를 위해 ‘4년 내 모든 취약 핵물질의 보안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핵안보정상회의에는 핵안보와 관련이 있는 50여 국가 정상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터폴, EU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전 세계에는 핵무기 약 10만 개 분량에 해당하는 약 2000톤의 핵물질이 쌓여 있는데, 정상회의는 그중에서도 우선 보안이 취약한 민수용 핵물질 500톤의 핵안보에 집중키로 했다.
1차 워싱턴, 2차 서울, 3차 헤이그, 최종적으로 다시 워싱턴 등 모두 4차례 핵안보정상회의를 거치면서 핵안보 국제레짐이 대폭 강화됐고 핵안보에 대한 의식도 크게 향상됐다. 무엇보다 실제 핵물질의 보안이 대폭 강화됐고 위험한 핵물질의 재고가 크게 줄었다.
4차 정상회의로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종료되지만, 앞으로 IAEA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핵안보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3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선도연설을 하고 있다.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 외교와 국익이 한반도에서 세계로 확장되는 특별한 계기가 됐다. 한국은 2012년 3월 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한 데 이어, 2016년 말에는 IAEA 핵안보 국제회의에서 각료회의 의장을 맡는다. 2012년 당시 국내에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시선이 별로 곱지 않았다. 우리 주 관심사인 북핵과 원자력안전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눈은 달랐다. 그동안 한국은 경제성장이 힘입어 경제선진국 그룹인 OECD 회원국이 됐지만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위는 이에 못 미쳤다.
그런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은 명실상부한 ‘지도적 중견국’으로 등장했다.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최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한 것을 국제사회가 높이 샀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숙원사업이었던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에도 중대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과연 핵안보 강화와 세계평화는 우리의 국익과 어떤 관계가 있나? 한국은 북핵 위협과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안보취약국,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자원·에너지 빈곤국, 대외적 경제의존도가 100%인 경제취약국, 해외동포 700만 명, 해외여행자 1600만 명의 개방적 세계국가 등 국가적 특성이 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한국은 국가적 생존과 번영, 그리고 해외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국익을 위해 세계평화와 국제교류와 통상이 필수 불가결하다. 핵테러 방지와 세계평화는 바로 한국의 핵심적 국익이 된다. 다시 말해 핵안보와 세계평화는 바로 한국의 ‘세계적 국익’이다.
2016.03.24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