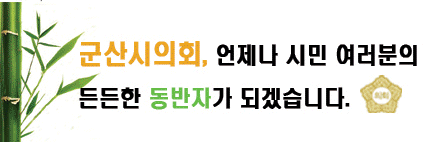▲ 추송 장덕준 선생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추송 장덕준 선생은 1892년 황해도 재령의 빈농 집안에서 태어나 명신중학교에 진학, 1911년에 졸업하고 모교 교사로 2년간 일했습니다. 1914년 평양일일신문사에 입사해 조선문 신문부 주간으로 근무하며 조만식, 김동원, 이덕환 등 평양의 주요 지식인들과 교류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이듬해 일본 유학길에 올라 세이소쿠(正則) 예비학교에 다니면서 재동경조선인유학생 학우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장덕준 선생은 1920년 민간신문인 동아일보 창간에 참여하여 논설반원과 통신부장, 조사부장을 겸했습니다. 선생은 창간 다음날인 4월 2일자부터 4월 13일자까지「조선소요에 대한 일본여론을 비평함」(필명 ‘추송’)이라는 논설을 통해 ‘조선자치론’과 ‘일시동인론’으로 3.1운동을 왜곡 보도한 일본의 여론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장덕준 선생은 동아시아를 방문하는 미국의원단 취재를 위해 1920년 7월말, 특파원으로 중국 북경으로 건너가 그들에게 조선의 독립요구를 알리는데 힘썼습니다.
▲1920년 4월 1일 창간된 동아일보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그러던 중 1920년 10월 일본군이 청산리에서 조선인 수천 명을 학살한 ‘경신참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군이 청산리에서 독립군에 패한 보복으로, 주민 5천여 명을 어른·아이 가리지 않고 학살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일제에 의해 정간처분(발행정지)을 받아 신문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장덕준 선생은 ‘신문은 정간 중에 있지만 기자의 활동은 중지할 수 없다’며, 보도할 지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학살의 진상을 취재하기 위해 10월 중순, 간도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11월 6일 간도에 도착한 장덕준 선생은 간도 용정에 이르러 여관에 여장을 풀고, 일본군 헌병대장을 찾아가 조선인 학살의 진상을 추궁하고 힐책합니다. 일본군측은 당연히 그러한 일이 없다고 부정하면서 후일에 함께 가보자고 약속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여관으로 돌아와 취재 중이던 어느 날 이른 아침, 선생은 일본인 두세 명에 불려 나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선생은 이날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발간한 독립신문(1921년 10월 28일자)은 「장덕준씨 조난논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선생이 일본군에게 암살당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29세였습니다.
▲ 장덕준 선생 (출처: 정진석 제공)
정부는 고인의 공적을 기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기자협회는 1971년, ‘기자협회 기장(記章)’을 제정하면서 장덕준선생의 투철한 기자정신을 기리고 본받자는 취지로 기념 메달의 뒷면에 선생의 얼굴을 새겨 넣었습니다.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파 청년지사로서 일본식민통치 아래 최초로 순직한 대한민국 언론인 추송 장덕준 선생. 평생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쳤고 일본에 의한 동포 학살의 참극을 세상에 알리고자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했던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참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출처: http://mpva.tistory.com/category/궁금-터[호국보훈이야기]/이달의 독립운동가 [국가보훈처 대표 블로그 - 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