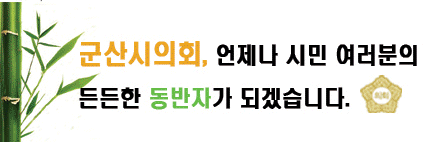[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제도 시행이후 우리말샘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0년간 국민이 제안한 신규어휘 438,932건 중 최종 반영된 신규어휘는 98,062건으로 반영률이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말샘 개통(‘16. 10) 이후 연도별 검토 및 처리 현황>
|
구분 |
2016 (10월~)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9월 기준) |
계 |
|
국민 제안 |
3,006 |
7,467 |
36,162 |
56,619 |
79,941 |
70,301 |
85,705 |
65,920 |
25,738 |
8,073 |
438,932 |
|
사전 등록 통과 |
<우리말샘> 등록 가능 판정 |
253,679 |
|||||||||
|
전문가 감수 중 |
국어 전문가 감수 1, 2단계 |
155,619 |
|||||||||
|
전문가 감수 완료 |
1,644 |
2,208 |
8,232 |
10,286 |
11,374 |
12,471 |
13,256 |
14,221 |
14,358 |
10,010 |
98,060 |
<자료제출 : 국립국어원, 2025.9>
2016년 10월부터 국립국어원이 시행 중인 우리말샘 제도는 국민 누구나 새로운 단어를 제안하면 전문가와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검증을 거쳐 공식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형 제도이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우리말샘은 ① 국민이 신규 어휘를 제안하면 ② 사전 담당자가 등록 가부를 판정하여 ③ 등록 가능 어휘는 우리말샘 참여자 제안 정보로 공개하고, ④ 우리말샘 참여자 제안 정보를 다시 국어 전문가가 감수하여 우리말샘 전문가 감수 정보로 공개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국민참여라는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온라인 사이트 ‘우리말샘’을 통해 국민이 단어를 제안하더라도, 신청 접수 이후 검토 시작이나 반려, 보류, 최종 반영 등 단계별 안내상황 등을 공지해주지 않아, 국민은 제안 이후 진행과정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참여형 제도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최종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패삼겹, 독서율, 혈압반지 등의 주요 단어들이 제안된 이후 진행상황이나 반영되지 않은 사유 등이 제안자에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려되지 않고 있는 주요 단어 사례>
|
구분 |
주요 어휘 |
|
전문가 감수 완료 |
간편조리식, 개찰일, 건배사, 고위험자, 다회용품, 단체 채팅방, 버거집, 사과초, 식음료품, 식자재용, 초고수, 칭찬감, 컵걸이, 편세권 등 |
|
전문가 감수 중 |
겉바속촉, 농특산품, 대패삼겹, 대회명, 독서율, 미입국, 비규제, 비대면형, 신산업군, 혈압반지, 재접수, 접종비, 초급매, 행정관급 등 |
<자료제출 : 국립국어원, 2025.9>
또한,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국민이 첫 제안한 이후 최종 반영되기까지 평균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된다고 밝혀, 제도의 취지하고 다르게 국민참여가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밝혀졌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2016년 3천건에서 2022년 85,705건(2,757% 증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2023년을 기점으로 감소해 2025년 9월 기준 다시 8천여건으로 줄어들었다.
국립국어원은 이에 대해 각 단계별 전문가 1명씩 총 3명이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고, 최근 5년간 예산집행내역을 보더라도 연간 3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예산 집행 내역>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예산액 |
4 |
3 |
2.88 |
2.88 |
2.88 |
|
집행액 |
3.91 |
2.93 |
2.88 |
2.81 |
2.83 |
<자료제출 : 국립국어원, 2025.9>
이에 대해 진종오 의원은, “최근 외래어를 비롯하여 신조어, 줄임말 등이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쓰는 언어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국어사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한글의 지속적 발전에 있어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
“다만, 국민참여형 제도임에 반해 국민과의 소통과정이 부족해 국민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말 제안 주간’ 운영, 우수 제안자 시상, 교육부와 협력한 학교 교육과정 반영 등을 통해 국민과 학생 모두가 우리말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